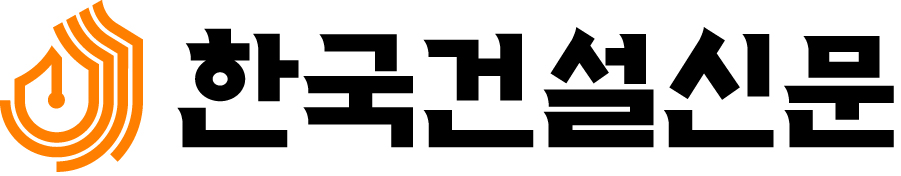현장의 애로사항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 산적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통해 실효성 갖춰야

‘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항상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가?’ 필자가 건설산업 및 관련 분야들과 관련된 정책세미나를 취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산학연 관계자들은 어떤 주제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현행법은 현장에서 작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월 21일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6년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정 부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시공토록 도입한 제도로,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금액 구간에 따라 직접시공의 의무 비율을 10~50%로 차등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서울시도 지난 2022년부터 자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핵심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독자적인 제도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 건산연은 지방계약 제도 및 서울시의 정책들은 건설현장 및 산업 실태를 고려한다면 업계에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원칙을 초과하는 과잉 규제로 작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하도급자 간의 도급계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입찰 브로커화 및 부실 업체 난립 관련 관행, 하도급자의 보호조치 관련 문제 등은 이미 타 정책 및 규제를 통해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정책을 또다시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시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도급 규제를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을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전문영역 일부에 관한 위임으로 인정해야 하나, 하도급을 통해 담보하는 전문영역을 훼손함으로써 오히려 업계 혼란 및 공사의 품질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난 6일 박용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총 35명으로 지난해(28명) 대비 오히려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자를 합친 사상자 수도 1,868명을 기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2년의 1,666명에 비해 되려 12.1%가 늘어났다.
더군다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착공한 건축동(棟) 수가 총 10만1,678동으로, 2022년 같은 기간 기록한 14만2,969동에 비해 28.9% 감소했음을 감안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의 의무 및 처벌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말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등 각 공사 주체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내용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현재 시행 중인 건설 관련법 및 제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상 그 어떤 법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모든 법과 제도는 ‘현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그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교범과 지침서에 담긴 형식과 이론에만 치중하는 대신 현장에 직접 나서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농사일은 마땅히 머슴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경당문노(耕當問奴)’의 고사가 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오피니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터뷰]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0) | 2025.02.28 |
|---|---|
| [변호사 칼럼] 분양계약 체결 후 기본적인 건축계획과 다르게 구조물이 설치된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 (0) | 2025.02.28 |
| 자격증 생각 - 왜, ‘국가자격’인가 (3) | 2024.12.27 |
| [논단] 미래지향적 건축물 탄소배출량 평가기술 (2) | 2024.12.16 |
| [인터뷰]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4) | 2024.12.04 |